|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2. 17 방송분) |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불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산업통상자원부가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저조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심해 원전 개발 사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경험하였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은 1973년 발생한 4차 중동 전쟁 시기에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 정책으로 오팩이라고 부르는 석유수출국기구를 만들고 갑자기 석유 가격을 70%나 인상하였으며, 다음해에 다시 석유가격을 128%나 인상함으로써 국제 원유가격을 4배나 폭등시켰고 그 여파로 전 세계 물가가 치솟는 등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은 사건이고, 두 번째 석유파동은 1978년 시작된 이란 혁명으로 석유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국제 석유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큰혼란을 겪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60, 70대가 대신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까마득한 이야기입니다만, 1997년 IMF 경제위기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육지에는 없는 석유를 바다에서는 찾을 수 있으리라는 산유국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1977년에는 바다에서 석유를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담은 ‘제7광구’라는 유행가가 크게 히트하였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석유나 천연가스만 찾아내면, 더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자극하는 혹세무민용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시작되었는데요.

“2023년부터 세계 최고의 심해 탐사기업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매장량이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시추 사업을 추진을 공언하였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정부는 최대 매장량 기준으로 석유는 4년, 가스는 약 30년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석유와 가스매장 가능성이 높은 일곱 군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의 이름을 붙였고, 그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예상했던 곳이 바로 이번에 실패한 대왕고래 지역입니다.
언론은 1차 시추가 실패로 드러나자 사업 유망성이 있다고 주장하던 미국 심해자원탐사기업 엑트지오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1차 시추이전부터 엑트지오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액트지오는 지난 2016년 설립돼 정부 사업을 수주하기에는 업력이 너무 짧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엑트지오 본사 주소지는 미국의 평범한 단독주택이었고, 계약직까지 포함해도 직원이 5명을 넘지 않으며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탐사기업에 대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밀어붙이자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2023년 125만달러, 지난해 170만달러 등 총 295만달러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는데요.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2년간 약 4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인데요. 이 돈만 낭비된 것이 아니라 1회 탐사비용으로만 약 1000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해수면으로부터 1km 이상의 심해에 매장된 석유가스를 시추하기 때문에 시추비용이 회당 1000억 원에 달하고, 매장량이 충분하여 실제 채굴을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아 수십조원의 추가 채굴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황당한 프로젝트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다른 후보지인 ‘마귀상어’ 프로젝터를 띄우고 있는데요. 액트지오는 지난해 말 정부와 석유공사에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큰 14개의 새로운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총매장량이 최대 50억배럴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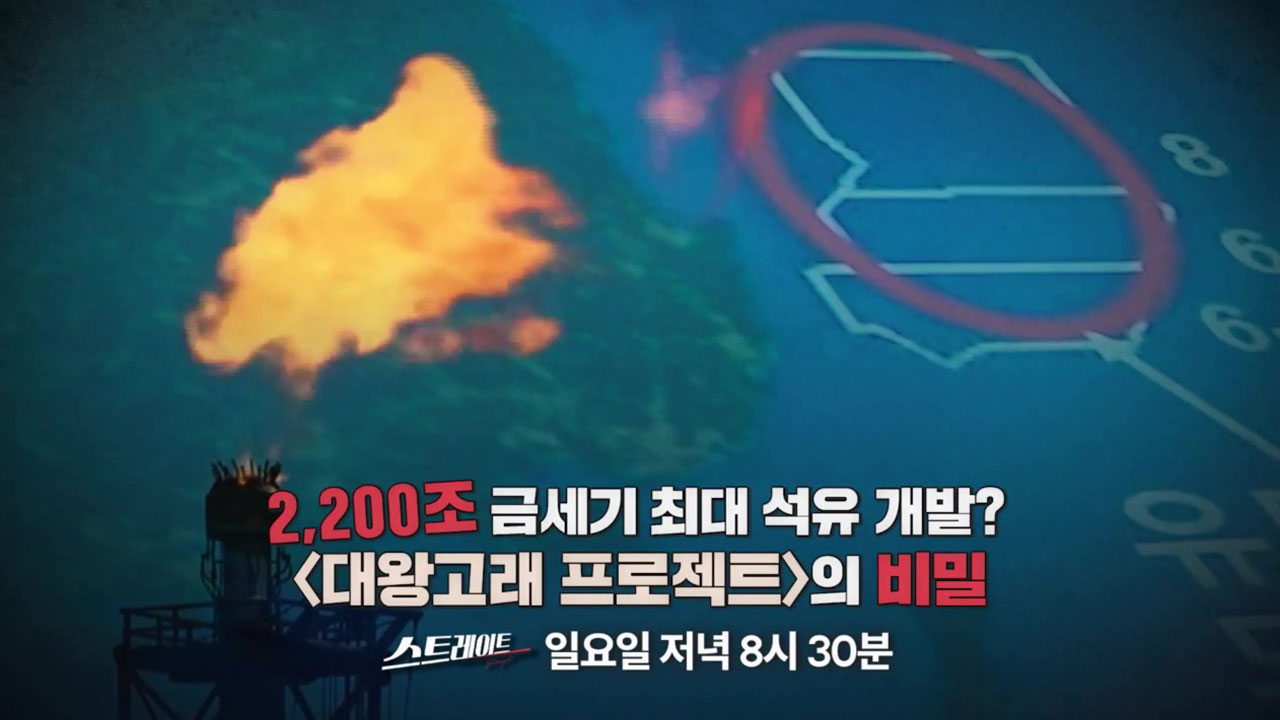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석유나 천연가스 매장량만 충분하다면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심해탐사를 위한 투자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후싱크탱크>를 비롯한 환경운동가들은 엑트지오의 탐사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지만, 백번 천번 양보해서 엑트지오가 주장하는 매장량이 발굴되어도 전혀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제에너지기구가 2023년을 기준 연도로 했을 때, 2050년까지 전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79%가 감소하고, 석유 수요도 77%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EU의 경우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협약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EU와 마찬가지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는데요. 정부 기대처럼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 비용으로 적게는 200조에서 최대 2400조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비용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1t이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을 추정해 계산하는 것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탄소 배출 비용은 약 38조원으로 추산하였는데, 동해 원전이 상업 개발되면 2021년 연간 탄소배출 비용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탄소 배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금 조달도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세계 50대 은행 중 절반은 신규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였고, 글로벌 상위 50개 손해보험사 중 13개 보험사는 보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석유 시추에 성공하더라도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화석연료 사업지원과 투자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들도 석유가스전 개발은 높은 비용과 기후환경 리스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역행하여 경제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석유가스 개발이 곧 에너지 안보”라는 20세기의 낡은 인식을 버리고, 21세기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